
반응은 다양했다. "당장 시행하라. 구독하겠다"고 격려를 해 주신 분도 꽤 있었다. "계좌 번호 알려달라. 돈 부쳐 줄테니"란 농반 진반 반응을 보인 분도 있었다. 기자를 잘 알거나, 친분이 좀 있는 분들이 주로 이런 반응을 보였다. 감사하기 그지 없다.
걱정어린 시선을 보내온 분도 적지 않았다. 혼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냐는 걱정이 가장 많았다. "1만 명 구독자를 유치한다는 게 가능하냐?"는 비판도 있었다. (그 와중에 "아르바이트 필요하면 연락하라"면서 틈새를 공략해 온 분도 있었다. 아르바이트가 필요할 경우 제일 먼저 그 분께 연락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물론 곧바로 '1인 유료화'를 하겠단 얘기는 아니었다. 회사의 녹을 먹고 있는 입장에서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투자대비 수익(ROI)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일에 전념할 테니 간섭하지 말라"는 말에 힘이 실릴 정도 돈은 벌어다줘야 한다.
그렇다고 장난으로 쓴 건 더더욱 아니었다. 내가 그 칼럼을 쓴 진짜 이유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 위해서였다. 누구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콘텐츠 유료화'에 대한 논의를 정면으로 해보고 싶었다. 핵심 상품을 직접 팔기보다는 '간접수익'인 광고가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현재 구조가 지속 가능한 모델인지 깊이 토론해보고 싶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한다.
◆미국도 광고 매출은 갈수록 감소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간단한 자료를 하나 살펴보자. 최근 발표된 미국 신문협회(NAA)의 매출 현황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미국 신문들의 구독료 수입은 5% 가량 늘었다. 많은 언론사들이 디지털 콘텐츠 유료화를 단행한 덕분이다. 하지만 광고 쪽 상황은 참담하다. 신문광고 수입이 9%나 감소한 것. 디지털 광고 수입이 5% 가량 늘긴 했지만, 덩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에 머무른다.
결국 지난 해 미국 신문업계 전체 매출은 2% 가량 감소했다. 신문업계의 최대 과제가 '0% 성장 달성'이 될 정도로 상황은 절박하다. 디지털 광고 수입 증가분이 인쇄 광고 감소분을 상쇄하는 '디지털 크로스오버'는 아직은 먼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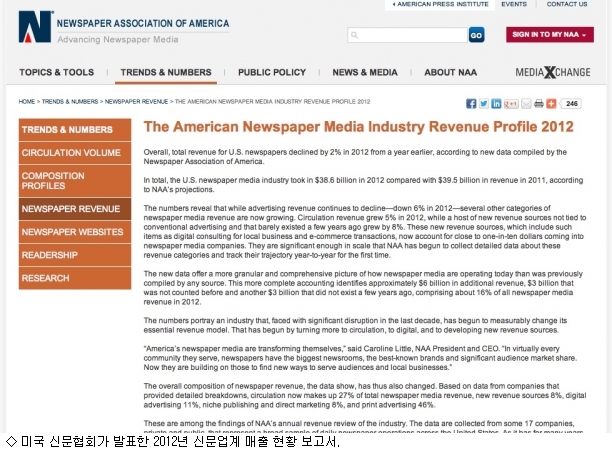
그 보고서에서 특히 관심을 가진 건 미국 언론들의 매출 포트폴리오였다. 광고와 구독료 수입 이외 비중이 8%에 불과했던 것이다. 엄청나게 취약한 포트폴리오가 아닐 수 없다.
우리 현실로 눈을 돌리면 사정은 좀 더 심각하다. 광고 시장 상황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매체 수는 계속 늘고 있어 광고 유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한 상황이다.
인터넷 언론사들의 사정은 좀 더 복잡하다. 구독료 수입을 크게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구독료는 '콘텐츠 유료화' 관련 수입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에선 디지털 콘텐츠 유료화를 통해 돈을 버는 언론사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타임스 같은 유료화 모델을 선뜻 들고 나온 언론사도 아직은 없다. 대부분 광고 위주 매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 인터넷 언론사들은 최근 들어 콘텐츠 유료화 쪽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퓨리서치센터 자료에 따르면 미국 1천380개 일간지 중 어떤 형태로든 디지털 콘텐츠 유료화를 단행한 곳이 450개사에 이른다. 물론 이들이 전부 수익을 내는 건 아니다. 하지만 콘텐츠 유효화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보다는 많이 약한 건 사실이다.)
◆콘텐츠 구입, 판단 기준은 뭘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부분이다. 왜 우리는 콘텐츠 유료화에 대한 장벽이 강한 걸까? 언론사들은 왜 자신들이 애써 만든 상품에 선뜻 값을 매기지 못하는 걸까?
우선 떠올릴 수 있는 건 "한국 언론들의 콘텐츠 중 돈 내고 볼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대답이다. 물론 그런 측면이 강하다. 특히 뉴스캐스트 이후 한국 인터넷 언론들은 차별화된 기사보다는 '차별화된(?) 제목'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긴 안목에서 경쟁력의 밑바탕이 되는 콘텐츠 품질보다는 당장 눈에 띄는 '트래픽'에 목을 맸다. '퀄리티 저널리즘'을 논하기 부끄러울 정도였다.
그러다보니 대체 가능한 콘텐츠가 너무나 많다. 고만고만한 기사들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유료화 장벽(paywall)'을 치지 못한다. 그마나 유지해 오던 광고 매출 모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자들의 거부감도 무시 못할 요인이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미국 같은 서양 국가들에 비해 '돈 내고 콘텐츠를 구입하는 문화'가 부족한 편이다. 그러다 보니 공들여 만든 콘텐츠라도 자신 있게 매물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그럼 콘텐츠 유료화의 진짜 동인은 뭘까?"
물론 독자들과 언론사들의 입장은 상반된다. 독자들은 당연히 "돈 내고 볼 만한 콘텐츠를 달라."고 외칠 것이다. 소비자로서 당연한 요구다.
반면 언론사들은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위해선 독자들이 먼저 지갑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민주 시민 혹은 기업으로서 저널리즘을 살리기 위한 후원금 정도는 낼 수 있지 않겠냐는 요구인 셈이다.
물론 유료화 장벽을 치는 언론사는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건 콘텐츠 상품 판매업자들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식 문제다. 기본적인 상도의인 셈이다. 하지만 그 기준이란 게 말처럼 쉽게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매출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다양하게 꾸미려는 언론사들의 고민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과연 여러분들은 콘텐츠를 구매할 때 어떤 잣대를 들이대는가? 해당 콘텐츠 자체의 가치인가? 아니면 언론의 지속 가능한 생존 모델에 대한 고려까지 하는가?
너무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느낌이 없지 않다. 찬성이든, 비판이든, 이 문제를 놓고 독자 여러분들과 진지한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산적인 토론이 우리 저널리즘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